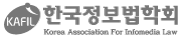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clusive License in Music Industry
 저자 김혜선, 이규호 저자 김혜선, 이규호
 권호 제 19권 제2호 통권 3호 권호 제 19권 제2호 통권 3호
 발행일 2015. 09.07 발행일 2015. 09.07
 요약 요약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트, 밀크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음악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점차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출판 등의 새로운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권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2011년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exclusivelicense)’와 유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타적발행권제도에 대해 ‘발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행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배타적 이용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타적발행권을 이용허락받은 자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배타적이용권’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배타적발행권은 음악 산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음악 산업 구조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음악저작물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저협(또는 함저협),음실연, 음산협과 각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각 단체의 신탁계약 규정에 의하면 배타적발행권자도 신탁을 할 수 있으나 효율성 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체결된 신탁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해지가 용이하지 않아 음악 산업에서 배타적발행권이 활용되기 어렵다. 일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전자서적에 있어서 출판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음악저작물은 전자서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일본 저작권법은 음악 산업에 있어 우리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 준물권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한편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는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발행권 제도와 그 대상이 동일하며, 배타적이용허락의 법적 성격을 ‘저작권의 이전’으로 보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준물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은 저작권양도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용허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배타적발행권의 개관
1.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및 도입배경
2.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3_김혜선
Ⅲ. 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
1. 음악 산업의 구조 및 현황
2. 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 제도의 문제점
Ⅳ.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제도와의 비교
1. 일본의 출판권
2.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
3. 소결
Ⅴ.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개선방안
1. 배타적발행권의 권리 범위
2. 전용실시권 및 전용사용권과의 비교
3. 신탁 및 대리와의 비교
4.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
Ⅵ. 결론
|